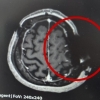유네스코 ‘문화유산’ 라보·발레 포도밭
제네바 호수에 선다. 지역명을 그대로 차용했다. 뭔가 호수의 유려하면서도 장엄한 자태에 걸맞은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소 아쉽다. 우리에겐 ‘레만 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부 현지 안내 책자에서도 레만 호로 표기하고 있다. 한데 이는 프랑스 쪽 이름이다. 프랑스가 호수 일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소유주’는 스위스다. 오래전 레만 호로 불리다 제네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호수 이름도 자연스레 도시 이름을 따라가게 됐다.

레만 호 주변의 포도밭. 예전 수도사들이 조성한 포도밭으로 현지에선 월이라고 불린다. 호수 너머 왼쪽은 프랑스다.


사진은 전통적인 스위스 샬레가 잘 남아 있는 그리멘츠 마을이다.
호수 주변엔 포도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저 유명한 라보의 포도밭이다. 200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올랐다. 기억할 건 ‘자연유산’ 부문이 아니라는 거다. 유네스코는 포도밭에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다고 봤다. 보다 정확히는 포도밭을 일군 수도사들의 땀과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포도밭 여정의 들머리인 로잔은 프랑스어권에 속한 도시다. 로잔에서부터 찰리 채플린이 생을 마친 브베, 록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음악적 영감을 키웠다는 몽트뢰가 차례로 이어진다. 로잔에서 브베 사이, 40㎞에 이르는 호숫가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 포도밭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 방대한 포도 경작지가 라보 지구다. 포도밭은 우리의 다랭이논과 흡사하다. 척박한 땅을 일구고 돌담을 쌓아 조성했다. 걸어 오르기도 쉽지 않은 비탈에서 땅을 갈고 돌을 쌓은 이들은 수도사다. 이들이 쌓은 돌담을 현지에선 ‘월’이라고 부른다. 포도밭을 씨줄날줄로 엮는 월의 길이는 무려 450㎞에 달한다. 우리 제주도 전체를 돌아가는 검은 돌담이 ‘흑룡만리’라면 이 지역에 펼쳐진 회색 돌담은 ‘회룡천리’라 해도 틀리지 않겠다.
돌담은 포도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개의 태양이 뜨는 포도밭’이라는 홍보 문구에 힌트가 있다. 우선 내리쬐는 일조량이 많다. 둘째, 햇빛이 호수에 반사되며 또 한번 아래에서 포도 알갱이들을 비춰 준다. 그리고 한낮의 햇볕에 잔뜩 달궈진 돌담이 저녁 무렵 복사열을 포도 알갱이들에게 되돌려준다. 그러니 포도가 당분을 잔뜩 머금을 수밖에. 우리 충주호 인근의 사과가 유난히 달고 맛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월 안쪽으로는 농가가 마을을 이뤘다. 대부분의 집들이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각 집안이 고유의 포도주 문장을 새길 만큼 자부심이 대단하다. 골목과 골목은 이어져 있다.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아도 골목엔 온기가 가득하다. 자연에 깃든 사람의 흔적, 유네스코가 인정한 건 바로 이 대목일 것이다.
레만 호를 따라 발레로 넘어간다. 레만 호 너머는 프랑스다. 스위스 땅을 달리며 프랑스를 엿보는 기분이 묘하다. 로잔 쪽 주민들은 대부분 프랑스어를 일상어로 쓴다. 호수 너머 프랑스의 영향 때문이지 싶다. 두 지역 주민들은 친할까. 같은 언어를 쓰니 이웃사촌처럼 지낼 것 같은데 현지 가이드는 뜻밖에 그리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앙숙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등 돌리고 사는 건 분명해 보인다.
레만 호를 낀 라보 쪽이 화사하다면 발레 쪽은 ‘장엄’에 가깝다. 알프스의 산군이 사방을 둘러쳤고 산 아래 분지엔 마을들이 오종종하게 몰려 있다. 그 가운데로 석회 성분 가득한 우윳빛 론 강이 흘러간다. 척박하면서도 이국적인 풍경이다.
발레는 오래전 빙하로 뒤덮였던 지역이다. 거대한 빙하는 아주 오랜 기간 산자락을 파며 흘러갔다. 현재의 분지 형태는 그 당시 형성된 것이다. 빙하는 녹으며 미네랄 등을 내뱉어 토양을 비옥하게 했다. 특히 청포도 계열의 스위스 토착 샤슬라 품종이 자라는 데 적합한 여건을 제공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또한 샤슬라 포도로 만든 ‘팡당’이라는 화이트 와인이 대부분이다. 팡당에 라클렛이 빠질 수 없다. 라클렛은 발레 지역에 전승되는 치즈 요리다. 큰 덩어리의 라클렛 치즈를 녹여 감자를 찍어 먹는다.
그리멘츠 마을에선 ‘글래시어(빙하)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이름처럼 ‘빙하’가 제조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빙하와 인접한 마을에서 생산된 와인’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겠다. 빙하 와인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우선 맛이 강하다. 시고 톡 쏜다. 와인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술에 가깝다. 한데 이게 ‘중독성’이 있다. 김치나 삭힌 홍어를 연상하면 알기 쉽다. 첫 맛은 좀 텁텁하지만 몇 잔 기울일수록 ‘술술’ 넘어간다.
제조 과정도 홍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아주 오래전 마을 어디선가 와인 담긴 오크통이 발견됐다. 일반적인 와인의 경우 오크통에서 한두 해 숙성시킨 뒤 마시는 게 보통인데, 이 와인은 달랐다. 처음엔 시고 떫었겠지만 늙은 와인이 주는 깊은 맛은 여느 와인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었다. 새로운 맛의 세계에 눈뜬 주민들은 와인을 오랜 기간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것으로 생산 방식을 수정했다. 사실 숙성과 삭히는 건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빙하 와인을 제조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오크통은 1886년산이다.
빙하 와인엔 나눔과 평등의 정서가 담겨 있다. 예컨대 이런 거다. 오크통마다 900ℓ의 와인이 담겨 있는데 해마다 가장 오래된 오크통에서 25ℓ를 빼 그다음으로 오래된 오크통에 넣는다. 낡은 것과 새것을 일정한 비율로 섞는 것이다. 이 작업을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1969년산 오크통에서 뺀 25ℓ를 1886년산 오크통에 넣는다. 이 늙은 오크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마을 교회의 비숍(주교)이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이 와인의 일부를 꺼내 온 주민이 함께 마신다. 마을 촌장이나 비숍 등 소수가 오래된 오크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오래 같이 마시자는 게 빙하 와인에 녹아 있는 정서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외지인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멘츠 마을은 스위스 특유의 샬레(오두막집)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12세기부터 목조주택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토속적인 호밀빵 제조 기법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샬레 앞 의자에 앉아 호밀빵 안주에 빙하 와인 홀짝대다 보면 스위스 전통의 향기가 몸에 배는 듯하다.
글 사진 로잔·시에르(스위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5-09-05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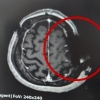


















![미국 맛 가미한 보물 찾기…한국 맛과 다른 백수 아빠[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