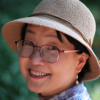이호준 시인·여행작가
그렇게 만나는 것들 중에는 고무줄처럼 하찮아 보이는 소품도 있다. 하필 고무줄 이야기냐고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리 가벼운 소재만은 아니다. 지금은 세월에 묻혀 잊히거나 밴드라는 대용품으로 바뀌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고무줄은 삶의 필수품이었다. 그래서 오일장 한 모퉁이 잡화 코너에 걸려 있는 색색의 고무줄과 마주치면 머릿속에 주마등이 불을 밝히고는 한다.
할머니가 장에 갈 때면 어머니는 고무줄을 잊지 마시라고 몇 번이고 부탁하고는 했다. 그만큼 살림살이에 중요한 게 고무줄이었다. 팬티를 ‘빤스’도 아닌 ‘사리마다’나 ‘사루마다’로 흔히 부르던 때의 이야기다. 팬티나 내복 같은 속옷에는 고무줄이 꼭 필요했다. 요즘이야 밴드 처리가 잘돼 있지만, 그 시절에는 고무줄을 넣어야 흘러내리지 않았다. 처음 끼워져 있던 고무줄은 오래지 않아 삭아 끊어지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갈아 끼워야 했다. 옷 하나를 기우고 또 기워서 입던 시절이었다.
또 하나 고무줄이 꼭 필요한 곳은 기저귀였다. 요즘은 대부분 펄프로 만든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을 앞두면 천기저귀부터 마련했다. 기저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무줄이었다. 기저귀에 쓰이는 노란 고무줄은 까만 고무줄이나 납작한 찰고무줄과는 달리 속이 빈 원통형이다. 값도 좀 비싸고 탄력도 좋았다.
고무줄은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놀이 도구였다. 사내아이들은 고무줄이 있어야 새총을 만들 수 있었다. 양쪽으로 균형 있게 벌어진 나뭇가지를 자른 뒤, 깎고 다듬어 거기에 고무줄을 묶고 가죽을 대어 새총 하나를 완성하면 세상 모든 새가 내 손 안에 들어온 듯 뿌듯하던 시절이었다.
고무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 건 여자아이들이었다. 고무줄놀이 때문이었다. 까만 고무줄 여러 개를 이은 긴 줄을 가진 아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고무줄놀이를 한 번 시작하면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다.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만이냐…’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느티나무집 마당에서 부르는 노래가 탱자 울타리를 넘어 귓전을 간질이던 시절의 필름은 언제 돌려도 가슴 저리게 아름답다.
개구쟁이 사내아이들은 연필 깎는 칼을 갖고 다니다가 고무줄을 끊어 놓고 도망치기 일쑤였다. 리본이나 머리끈이 흔하지 않던 시절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묶는 데도 고무줄은 유용하게 쓰였다.
미용실 같은 곳이 아니라면 고무줄 정도야 없어도 문제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이들도 더이상 고무줄놀이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안쪽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고무줄은 여전히 절절한 그리움이다.
팍팍한 삶에 지쳐 지나간 날들이 그리워지면 시골장으로 간다. 거기서 만나는 온갖 이야기들은 가슴을 쓸어 주는 위안이다. 시간의 뒷전을 서성거리는 까맣고 노란 고무줄은 탄력 잃은 내 삶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 준다.
2017-08-30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