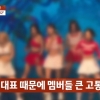朴대통령 서명 비판하고 김구 참배…정체성 혼란 우려김한길 “대통령 임기내내 국회탓”…한상진 “광복정신 계승”아이들미래위 대표에 천근아…인재영입 부진 ‘조바심’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가 연일 터져나오는 논란을 진화하느라 부심하고 있다.국민의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 동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했다.
한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에 이어 전날 최원식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서명에 대해 긍정 평가한 브리핑이 논란이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지세력을 보수 중도층으로 확장시켜갈지, 정통 야권 지지대열을 공고히할지, 또 노선과 이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초래된 ‘좌충우돌’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마포 창준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을 ‘길거리 운동, 길거리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전대미문의,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의원도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것도, 임기 내내 국회 탓만 하는 대통령도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전날 박 대통령의 서명 참여에 대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다’는 브리핑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원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발언 취지를 해명하고 “대통령이 길거리로 나간 것은 웃음거리”라고 맹비판했다.
회의에선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시계는 멈췄다. 무능한 여야, 국회 탓만 하는 대통령이 각자 주장만 하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사퇴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퇴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면 국민 수준을 잘못 안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의원은 문 대표의 연대 제안을 두고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왜 이런 분란을 자초했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4·19 단체를 방문해 ‘이승만 국부 발언’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은 회의 참석 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참배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김구 선생의 국민통합과 광복 정신을 잇고자 한다”며 ‘국부’ 발언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최근의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오락가락’ 하면서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정체성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탈당한 이후 정체성에 배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체성을 깨뜨리는 게 결코 새정치는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더민주와 차별화를 통해 중도와 보수층을 공략하는 동시에 전통적 야권 지지층도 잡으려는 전략이 혼선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아이들미래위원회 대표로 천근아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 아이들미래위원회는 육아·아동복지 및 청소년 문제 전반의 해법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더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인사 영입이 더딘 데 대한 조바심도 표출되고 있다.
이날 인선 발표에 배석한 김영환·김관영 의원은 안철수 의원측 ‘원년멤버’이자 창당 발기인인 천 교수를 “인재 영입” 사례라고 소개했다.
더민주 내 수도권 의원 거취에 있어 ‘키맨’으로 평가받는 박영선 의원이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까지 합류가 불투명해진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당 합류가 예상됐던 최재천 의원도 안철수 의원과 야권통합에 대한 의견차로 합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