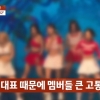중국인 부부 브로커에 2천만원 주고 ‘환승관광’ 준비
인천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뚫은 중국인 부부는 애초 ‘환승자격 관광’ 제도를 악용해 밀입국을 시도했다.허모(31)씨와 펑모(31·여)씨 부부가 인천공항에 들어온 것은 이달 20일 오후 7시31분께였다.
단체관광 비자를 받아 일본에 여행 갔다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
이튿날인 21일 오후 8시17분 출발 예정인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떠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거액을 들여 밀입국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1인당 우리 돈으로 1천만원에 달하는 6만 위안씩 총 12만 위안을 제공했다.
브로커가 알려준 밀입국 방법은 ‘환승자격 관광’이었다. 선진국 공항에서 출발했다가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떠나는 외국인이 환승 대기시간 동안 공항에서 가까운 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허씨 부부가 첫 여행지로 일본을 택한 것이나, 환승 대기 시간을 24시간 정도로 잡은 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브로커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을 개시했다. 먼저 환승 대기구역인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이 아닌 2층 입국 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까다로웠다.
“얼마간 체류할 계획이냐”라는 심사관의 첫 질문에 허씨 부부는 “하루 이틀 관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런 질문은 이미 준비한 듯 자연스레 답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딱 걸렸다. “숙박하는 호텔은 어디이고, 교통편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예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사관은 이들이 보유한 일본 입국비자가 ‘단체관광 비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통 단체관광 비자로 외국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탈 때 환승자격 관광도 단체로 신청하는데 이들은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심사관은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허씨 부부의 밀입국 계획에 첫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밀입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거액을 들여 꿈꿔온 코리안드림을 놓칠 수 없었다.
몇 시간 고민을 거듭하던 허씨 부부의 눈에 띈 것은 오후 11시를 넘어 운영이 종료된 3번 출국장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키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공항 상주직원 출입문에 다가서니 스크린도어는 저절로 열렸다. 남은 것은 여객터미널의 일반구역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이었다. 여기만 지나면 밀입국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판사판이었다. 미닫이문 하단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력을 다해 흔들었다. 바닥과 잠금장치를 고정한 나사못이 오래된 탓에 쑥 뽑혔다. 9분간 요란하게 문을 흔들어댔지만, 공항 경비원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워낙 대범하게 흔드는 모습에 문을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착각한 탓이다.
허씨 부부가 별로 어렵지 않게 밀입국에 성공한 시간은 21일 새벽 1시25분이었다.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간 이들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인 천안으로 향했다.
도피 행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밀입국 나흘 만인 25일 오후 4시40분께 천안 공설시장 인근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발각됐다.
이들을 긴급체포해 조사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오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기소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거쳐 중국으로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자리를 위해 무모하리만큼 준비해온 ‘밀입국 드라마’가 강제추방으로 끝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달해 중국 공안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밀입국 당시 3번 출국장에서 경비를 섰던 보안업체 직원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