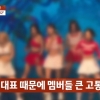교통 인프라 확대 등 고민…‘메가시티’ 유지하면 지방과 제로섬 게임 우려“전국 차원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문제 연구해야”
한 없이 팽창할 것만 같던 서울시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 상징적인 1천만명선이 무너졌다.1천만명의 의미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 젊은층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다는 점은 공통으로 꼽히는 문제다.
서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등과 연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 전세난에 1천만 서울 시대 막내리고 경기도는 인구 증가
서울 주민등록인구는 1988년 1천만명을 넘어섰다. 1992년 1천93만 5천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 왔다.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는 20만명 선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시 영역을 확장해 해방 무렵에는 약 90만명으로 늘었다.
한국전쟁 때 65만명 수준으로 도로 줄었다가 1960년 245만명, 1970년 543만명, 1980년 836만명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농촌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와 꿈을 찾아 일단 서울로 상경하던 것이 1960∼1970년대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며 무작정 짐을 싸서 서울역에 내리던 발걸음이 줄었다. 1990년대 인구 분산 정책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개발로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서울 인구는 저층주택을 고층아파트로 바꾸는 뉴타운개발에 힘입어 2005년(1천16만 8천344명)에 바닥을 치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2기 신도시(판교, 파주, 동탄 등) 개발 등에 따라 2010년(1천31만 2천545명)을 정점으로 다시 내리막을 탔다.
지난해는 13만 7천256명이 감소하며 1997년(-17만 8천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1천2만 2천181명을 기록한 서울시 인구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감속해 5월 말 기준 999만5천784명으로 내려앉았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5년 전보다 가구수가 늘어난 구는 11개에 이른다. 특히 원룸 밀집지역이 형성된 관악과 동대문 등 7개 구는 인구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가구수는 늘어 ‘1인 가구’가 급증했음을 방증했다.
이렇게 서울이 쪼그라들고 늙고 혼자가 되는 동안 경기도는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탈서울 인구를 흡수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며 외국인 거주자는 늘어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서울에는 중국 교포 등 외국인 거주자들이 작년 말 기준 27만 4천957명에 달한다. 2000년 6만 1천920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기로 머무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외국인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을 떠나는 30∼40대 ‘전세 난민’
서울 인구 1천만명선이 무너진 것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활발하게 생산·소비활동을 벌이는 30∼40대 젊은 층이 전세난민으로 등떠밀려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것에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순유출한 30∼40대 인구는 7만 3천223명으로 전체 순유출인구(13만 7천256명)의 53.3%를 차지했다.
이들의 자녀 세대인 0∼9세 아동(2만 2천744명)까지 포함하면 9만 5천967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30∼40대 인구 순유출은 10년 전인 2006년 3만 3천202명에 비해 2.2배로 뛰었다.
최근 5년간(2010∼2015년) 서울 인구의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는 감소, 50세 이상은 증가로 뚜렷하게 갈렸다.
특히 결혼 등으로 가구주가 되는 30대는 이 기간 20만 1천194명(-11.8%)줄었고,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기회를 찾아 상경하는 20대도 13만 5천463명(-8.7%) 감소했다.
자녀를 둔 가구인 40대는 4만 7천939명(-2.8%) 줄었고, 부모를 따라 이사가는 10대는 26만 2천199명(-21.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0∼9세는 저출산까지 겹쳐 7만 6천22명(-8.9%) 감소했다.
반면 50세 이상 인구는 43만 3천653명(14.4%) 늘었다. 세분하면 50대는 6.0% 늘었고 60대 15.9%, 70대 31.1%, 80대 37.2%, 90대 38.6% 등으로 고령화가 뚜렷했다.
◇ ‘거대도시 유지 시도할까 말까’…“인구 이동보다 고령화가 더 문제”
서울시는 30∼40대 젊은층을 몰아내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가정을 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30∼40대가 없으면 도시는 힘을 잃게 된다.
젊은층이 서울을 등진 주된 요인은 ‘전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순유출 인구 가운데 ‘주택’ 때문에 서울을 뜬다는 사람이 61.8%(8만 5천명)였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아이 키우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연구원과 함께 인구 문제를 본격 스터디하고 있다. 1천만명 붕괴의 의미를 풀어내고 그에 따른 장기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일단은 ‘인구’ 기준부터 재해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인구, 즉 투표권자의 숫자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 측면에서 인구 1천만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에 앞서 어떤 기준으로 인구를 파악해야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 주민등록인구에는 서울시의 정책이 직접 닿지 않는 거주불명등록자와 재외국민이 포함돼있다. 반면, 서울시의 주요 정책 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빠져있다.
또 서울시 인구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행정 권역 기준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람들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움직였을 뿐인데 통계적으로 유출, 유입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나 주간인구에 초점을 맞춰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 활기는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거지는 옮겨갔어도 경제활동은 계속 서울에서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간인구는 2000년 1천18만 9천317명에서 2010년 1천36만 9천684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도 2000년 491만 7천명에서 2010년 518만명, 2014년 538만 6천명으로 늘고 있다.
다만, 일단 숫자로 드러난 인구 유출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당장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도시공간실장은 “서울에서 빠져나온 사람 대다수가 경기도로 밀려오는데, 직장은 여전히 서울인 경우가 많아 직장과 주거가 떨어져 있는데 따른 문제들, 이를테면 교통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람들이 서울로 다시 돌아오도록 각종 인프라를 더욱 모아둘지,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원거리 이동을 할 필요가 없도록 확산시킬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인 가운데 서울이 메가시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경우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일 연구위원은 “사실 1천만명이라는 숫자 보다도 10배쯤 더 큰 문제가 고령화다”라며 “도시가 서서히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