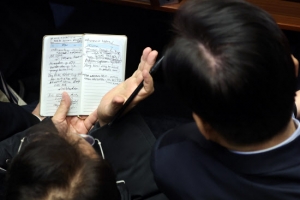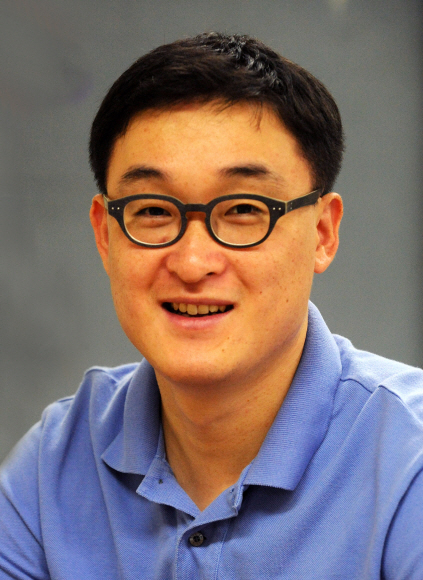
최재헌 국제부 기자
이상한 점은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이처럼 높은데도 여전히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가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인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 의료 보험 기관이 자율적으로 맡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합당한 비용을 낸 사람에게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문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경쟁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유독 의료 시장에서는 이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와 제약사 간의 독과점으로 의료비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실제 미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7%인 48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에서 찢어진 무릎을 제 손으로 꿰매고, 돈이 없어 잘린 두 손가락 중 한 곳만 봉합하는 것이 현실이라니 의아할 뿐이다.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의료 보험을 낼 수 없는 게 더 두렵다는 이야기가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줄이고, 전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이다. 비효율의 극치인 미국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한 나라의 인구에 달하는 4800만여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일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를 두고 벼랑 끝 대치 끝에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다행인 점은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공화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조만간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가 인간의 기본권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분야에서만이라도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goseoul@seoul.co.kr
2013-10-0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