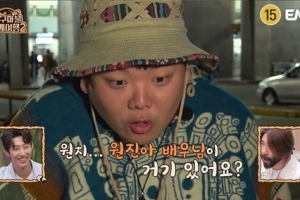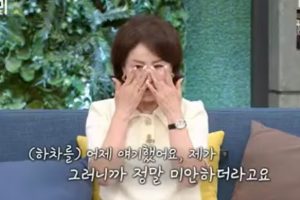2860만명 vs 437개 · 1만원=20만원+ α · 37만원
최근 박인비(25·KB금융그룹)의 미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3연승으로 국내 골프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가 파악한 지난해 국내에서 골프를 즐긴 연인원은 2860만명. 골프는 ‘산업’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 유일한 스포츠다. 자연을 벗 삼아 수십만 평의 대지 위에서 즐기는, 스케일 큰 운동이기도 하거니와 이를 둘러싸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다. 이런 골프는 나라의 정치 상황, 경제 곡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골프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푸른 잔디를 거닐며 우아하게 즐기는 ‘귀족 스포츠’ 골프. 하지만 국내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적자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사진은 7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질 감정가 934억원짜리 골프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로 근무하는 C(37) 과장.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하루 100번 이상 숨가쁘게 포지션(달러 매수·매도에 대한 전략)을 바꿔 잡는 이른바 ‘1초의 승부사’지만 그도 가끔 이성을 잃을 때가 있다. 그린 위에서다. 화창했던 지난달 22일 서울 근교 N골프장에서 고교 동창생들과 라운드를 할 때였다. 그는 전홀에서 4명이 나란히 동타를 쳐 주인을 찾지 못한 1만원에 해당홀 스킨(상금) 등 2만원이 걸린 50㎝짜리 버디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놓친 버디가 눈에 밟힌다.
그도 그럴 것이 일곱 번째 홀 만에 처음 딸 수 있었던 스킨인지라 잔뜩 긴장을 한 나머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그만 뒤땅을 친 것이었다. 평균 80대 중반을 치는 보기 플레이어인 그였다. 사그라지지 않는 분함의 절반은 꺼진 자존심이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는 결국 이후 ‘멘붕’에 빠져 18개홀이 모두 끝날 때까지 한 푼도 따지 못하고 동창들이 찔러 주는 개평 2만원에 “에이, 뭘” 하며 처참한 심정으로 바지 주머니를 열었다. C 과장에게 부여된 환차손 재량권은 무려 4억원. 달러를 사고팔다가 하루 4억원까지 손실을 입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가 불과 몇 만원 때문에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실감은 설문조사로 확인된다. 경기 파주의 K골프장이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기 골프에서 골퍼들이 느끼는 1만원의 체감가치는 20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답한 골퍼가 전체 60%인 18명에 달했고, 40만원 이상이 3명, 30만원 3명, 10만원 6명이었다. K골프장의 Y대표는 “내기 골프에서 1만원은 일상생활에서의 1만원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골프 타수와 구력 등 자존심까지 걸린 만큼 순간적인 체감가치는 10만원을 훨씬 웃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자존심 등 화폐가치 외적인 부분을 계산에 넣는다면 100배인 100만원까지도 추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이종관 홍보팀장은 “내기 골프는 일반 경제학에다 기회비용과 효용이론까지 보태져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통 홀당 상금 1만원의 순수 가치에다 기회비용이 추가되고, 여기에 ‘+α’가 더해져 체감가치는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면 10시간(왕복 차에서 보내는 시간 포함) 정도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과 휴식을 포기한 대가 등 갖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하루 라운드에서의 1만원 가치는 대략 5만~10만원가량으로 불어난다.
골퍼의 성격에 따라 1만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골프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즐기는데, 이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의 상당수는 다혈질이면서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쟁에서 지면 무너진 자존심을 참지 못하는 성향을 보인다. 흔히 ‘배추잎’이라고 부르는 1만원짜리 한 장 때문에 캐디를 들들 볶기도 한다. 물론 반대도 있다. 유순하고 느긋한 성격의 골퍼들에게 1만원의 가치는 그저 골프를 더 재미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골퍼로 하여금 본전을 생각나게 하는 건 내기 골프의 1만원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 사용료, 바로 ‘그린피’다. 바닥을 쳤다던 경기는 아직 불황을 헤매고 있다. 지갑은 얇아졌지만 비즈니스성 골프를 멀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수도권 골프장 기준 그린피는 여전히 주말 20만원을 웃돈다. 업계는 “그린피의 절반은 세금”이라고 말한다.
2012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를 합쳐 437곳(군·경 골프장 24곳 제외)이다. 2000년 200여곳에 불과하던 골프장이 13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06년 이후 260곳이 영업을 시작했다. 골프장 공사 중인 곳이 64곳이다.
얼핏 보면 골프장은 호황 같지만 들여다보면 죽을 맛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내장객 감소까지 겹쳐 한국 골프장들은 그야말로 악전고투 중이다. 절반 이상의 골프장이 적자를 내고 있다. 업계는 50여개의 골프장이 부도 직전이거나 매물로 나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급이 늘고 장사가 안되면 물건 값을 내려서라도 파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그런데 골프장은 공급이 늘고, 또 수십 개 골프장이 부도 직전에 처할 만큼 한 푼이 아쉬운데도 그린피는 요지부동이다. 골프의 이상한 경제학에 고개가 갸우뚱하겠지만, 사실 그린피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꽤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송용권 이사는 “예전처럼 그린피를 특정 액수에 묶어 놓은 골프장은 몇몇을 빼곤 이젠 찾기 힘들다”면서 “공식적인 가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비수기와 성수기 등 계절과 요일, 하루 시간대에 따라 50원부터 60원, 70원 등으로 세분화해 그린피를 책정하는 정책이 보편화된 지 이미 오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보자. 최근 전문지 ‘골프매거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32개 골프장 가운데 30여 곳이 토요일보다 일요일 그린피를 싸게 책정하고 있다. 금액은 보통 1만~2만원 차이지만 시간대에 따라 3만~5만원이나 차이 나는 곳도 있다. 국내 모 그룹이 운영하는 춘천 라데나골프장은 토요일 그린피가 23만원이다. 그러나 일요일 이른 시간과 오후 시간대에는 18만원을 받고 있다. 몇 시간 사이 무려 5만원 차이가 난다. 퍼블릭도 마찬가지다. 경북의 블루원상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3만원 차이가 난다.
물론 이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경우다. 서울 도심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이른바 ‘블루칩 골프장’의 그린피는 경기에 아랑곳없이 대못을 박아 뒀다. 경부고속도로변 판교에 있는 남서울골프장의 토요일 그린피는 무려 26만원이다. 평일도 22만원이나 된다. 공급과 수요 그래프를 이용해 경제이론에 맞게 그린피를 책정한 영리한 골프장이다. 한데 수도권이 아닌 경남 남해의 한 골프장은 최근 37만원이라는 국내 최고가의 그린피를 책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거리와 그린피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언뜻 보면 무모한 정책인 것 같지만, 이젠 엄연하게 시장 공략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가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병규 기자 cbk91065@seoul.co.kr
2013-07-0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