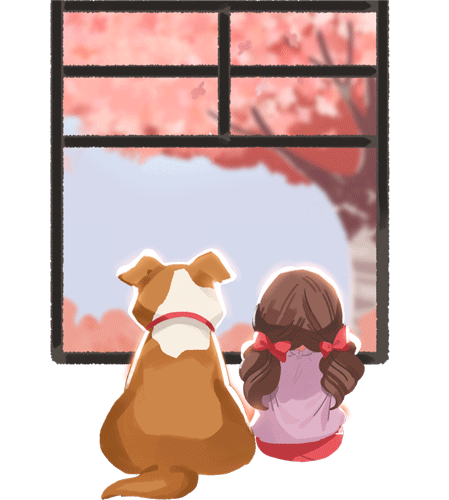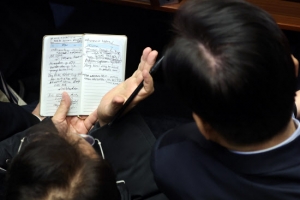소장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이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난 건 2001년 3월쯤 국민의 정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였다. 조희준 씨는 당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회장이었다. 남편과 두 딸이 있었던 차영 전 대변인은 이듬해인 2002년 중반쯤부터 조 씨와 교제에 들어가 7월에는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조씨는 2002년 11월쯤에는 차 씨에게 고가의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청혼을 했고, 두 딸을 미리 미국으로 보내면 유학비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차 씨는 결국 2003년 1월 남편과 이혼한 뒤 조 씨와 동거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조 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차 씨에 따르면 조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 하와이에 가 있으면 법인을 새로 설립해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며 출국을 강권했고 아이도 하와이에서 출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2003년 3월 하와이로 출국해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고 차씨는 주장했다. 그런데 조 씨는 당초 약속대로 2003년 12월까지는 아들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달 1만달러(한화 약 1200만원)를 줬는데, 2004년 1월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이에 차 씨는 2004년 2월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조 씨를 만나기 위해 갓난아기와 일본으로 건너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조 씨가 만나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같은 달 한국으로 들어와 조용기 목사를 만나 조 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십여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고 차 씨는 주장했다.
아들의 친생자 문제와 관련해 차 씨는 2013년 2월쯤 조용기 목사의 요청으로 조희준 씨를 제외한 조 목사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조용기 목사의 장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혐의로 구속됐던 조희준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돼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다는게 차 씨의 주장이다.
차 씨는 친생자 확인,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와 함께 7억 9800만원에 이르는 과거 양육비의 일부로 1억원과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조 씨와의 만남으로 차 씨 이전 가족은 비극을 맞게 됐다. 차 씨 자신은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2003년 12월까지는 조 씨가 최고급 레지던트에 최고급 리무진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등 “자신과 결혼하면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연락을 끊은 채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극도의 배신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차 씨의 큰 딸은 하와이에서 한 학기만 마치고 돌아왔으나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 등으로 곧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조 씨와의 연락 두절로 생활이 곤궁해진 차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여 뒤인 2004년 8월 전 남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했다.
차 씨는 “이런 비극적인 일의 모든 책임은 온갖 감언이설로 가정을 파탄 낸 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조 씨에게 있다”며 우선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뒤 추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조씨는 A군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 왔지만 아이가 벌써 10살이나 돼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월 700만원은 조씨가 과거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의 법원 판결을 참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