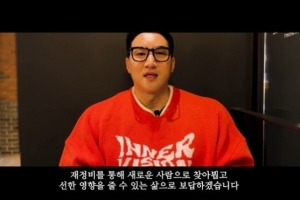아동보호전문기관 신군 학대가정 작년 4월까지만 관리 당시 강제할 시스템부재·애매한 사후관리 방치로 이어져
계모의 학대 끝에 결국 숨진 신원영(7)군은 작년 4월까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와 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내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는 학대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이를 강압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던 권한 부재, 모호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낳은 비극이었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원영군의 가정 학대가 최초로 신고된 것은 2014년 3월이었다.
당시만해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학대를 발견한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신고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접수됐다.
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원영군의 가정을 방문한 것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뿐이었다.
당시 학대 증거 사진이 있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강제적으로 원영군을 부모와 떨어트려 놓지 못한 이유는 “내가 키우겠다”는 친부의 주장 때문이었다.
현장조사로 가정을 5차례나 찾아갔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계모 때문에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각한 아동학대 발생시 가해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더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때부터 약 1년간 원영군의 부모와 원영군 남매, 할머니 등을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전화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4년 8월엔 원영군을 면담한 지역아동센터 측이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달해왔고, 그 이후부터는 학대 재발여부를 관찰하는 사후관리로 들어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재발여부를 확인하며 사후관리 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상담원에 따라 3∼6개월 정도만 사후관리한다 점은 현 시스템의 허점이다.
이러한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마저 같은해 4월 원영군 누나의 학교 교사와, 당시 누나를 키우던 할머니 등을 면담하고선 “아동학대 요인이 사려졌다며”고 판단하고 원영군 가정의 아동학대 관찰 및 사후관리를 완전히 종결했다.
누나의 학교에선 “양육 환경이 좋아졌다”고 했고, 할머니는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 기관에서 더이상 안왔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원영군이 외조모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만 알려왔고, 그렇게 원영군은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 10개월만에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지고야 말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전이라 상담원들이 할 수 있던 게 없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사후관리도 문제다”라며 “한시적인 사후관리보다 가해 부모가 최종적으로 교화될 때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상담원 확충과 충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