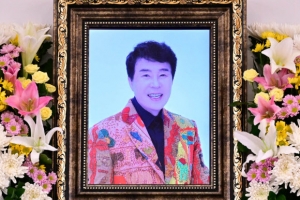年 철새 5000여 마리 ‘신검’ 8년간 337종에 한국 가락지…연구원 12명 중 9명이 계약직 “새와 ‘결혼’했지만… 지원 열악”
우리나라에 철새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는 국내 유일의 국립공원연구원 소속 ‘철새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센터는 2005년 7월 홍도에서 처음 출발했지만 2010년 흑산도에 건물을 새로 짓고 본부를 옮긴 뒤, 홍도는 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원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새를 왜 연구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센터에는 총 12명의 연구원들이 소속돼 있다.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흑산도를 찾아 철새 때문에 섬에서 둥지를 틀게 된 연구원들의 애환과 센터가 하는 일 등을 취재했다.

홍길표 철새연구센터 팀장은 “센터가 문을 연 뒤 지금까지 가락지 부착과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총 337종의 철새를 관찰했다”면서 “한반도 전체에서 관찰된 518종 가운데 65%가 흑산도와 홍도를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흑산도는 홍도보다 크기 때문에, 먹잇감과 마실 물도 풍부하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초지와 습지가 잘 발달된 흑산도의 배낭기미습지(8764㎡)를 주 무대로 철새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습지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도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12명의 연구원들은 본부 건물 옆에 마련된 숙소(원룸 형태)에서 생활한다. 이 중에는 4명의 여성 연구원도 포함돼 있다. 숙소에 들러 연구원들과 하루 일과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연구원들은 기상해서 습지에 포획 그물부터 설치했다. 습지를 가로지르는 데크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 그물을 설치했다. 철새를 포획해 새 종류와 특성 등을 파악한 뒤 가락지를 끼워 돌려보내기 위해서다. 그물을 설치하고 철수한 뒤 매시간마다 철새가 걸려들었는지 현장 확인에 나섰다.


그물에 걸린 철새 포획작업


포획된 새의 특성조사


가락지 부착 작업


철새 탐조 모니터링
연구원들은 가락지 부착을 통해 새들이 흑산도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또한 어느 계절에 어떤 종류의 철새들이 찾아오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오염지역에서 날아온 새의 질병을 분석하기 위한 분변 채취와 정밀분석 의뢰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연간 5000여 마리의 철새를 포획해서 발에 가락지를 끼운 뒤 날려보내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열고 8년간 가락지를 부착한 새가 총 4만 마리에 달한다. 가락지를 부착해서 날려보낸 다른 나라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철새 연구는 초보 단계나 다름없다. 미국은 연간 100만 마리, 일본과 중국만 해도 연간 20만 마리를 포획해 가락지를 끼워 날려보낸 뒤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철새들의 도래 시기와 서식지 변화까지 분석하기도 한다. 연구소도 일본은 60곳, 중국은 70곳에 달한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80년 전부터 철새 연구를 시작해 자격증을 가진 연구자들만 수백명이고, 동호회도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는 아직 자격증 제도도 없을뿐더러 철새를 연구하는 곳도 턱없이 빈약한 수준이다.
또 국내 유일의 철새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빈약하기 그지없다. 인력구성만 봐도 현재 근무 중인 12명의 연구원 가운데 3명(센터장, 팀장, 책임연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이들은 지원과 처우도 열악하지만 오로지 새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에 센터 근무를 지원한 사람들이다. 연구원들은 “새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화려한 도시 문화를 잊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전남 광양이 고향인 서슬기(27·여) 연구원은 2010년 철새연구센터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조류에 대해 관심을 갖던 중 센터 근무를 지원했다고 한다. 경기 용인이 고향인 박세영(31·여) 연구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센터에서 근무한 지 꼭 1년이 됐다고 소개했다. 여성 연구원들은 “새에 대해 미치지(?) 않고는 답답해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때론 땡볕에 얼굴이 탈까 봐 모자를 쓰는 것조차 호사스럽게 느껴진다”며 웃었다.
세계 각국은 미래 자원으로 부상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생물자원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철새연구센터도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건물을 새로 짓고, 연구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세울 만한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인력과 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빙기창 책임연구원은 “흑산도와 홍도를 찾는 철새 외에 육지와 연계할 수 있는 권역별 연구소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가 빈약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철새들이 항공기로 빨려들어가 사고(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건수가 연간 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해외에선 철새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한 연구 결과를 이용, 항공 사고를 막는 데도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하나뿐인 철새연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신안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0-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