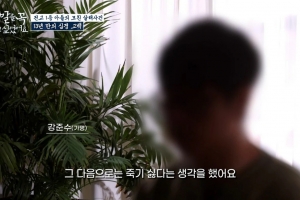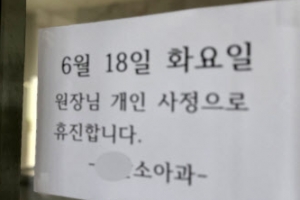심재억 전문기자
입가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이는 두 눈을 까뒤집고 온몸을 덜덜 떨어댔다. 아이들이 몰려들어 진을 친 가운데 선생님이 이마를 짚는다, 이름을 부른다 했지만 헛일이었다. 도리없이 둘러업고 양호실로 뛰었다. 양호실이라야 교무실 한쪽 나무 침대에 카키색 군용 담요 한장 덮어 놓은 게 전부였지만 서늘해 땀은 식힐 만했을 터인데, 그 뒤로는 그 아이 얘기를 듣지 못했다. 교실로 돌아와서야 한 마을에 사는 아이로부터 “간질병인데 치료도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들었고, 그게 무슨 병인 줄도 몰라 막연하게 ‘실성’ 같은 말을 떠올렸을 뿐이었다.
그 아이를 다시 본 것은 며칠 뒤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아이의 얼굴이 파리했다. 몇 걸음 떼다 돌아보니 수수깡으로 짜 맞춘 듯 부실해 뵈는 어깻죽지가 금방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 후 그를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도 다른 간질환자들처럼 세상의 강고한 편견에 짓눌려 피지도 못하고 스러졌을 것이다. 그 시절의 그에게 간질은 가혹한 운명, 무거운 천형이었을 것이다. 어떤 병도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어 치료할 수 없는 일이니, 그 시절의 인지 수준만큼 그는 몸을 앓고 또 마음을 앓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말갛게 씻어 헹군 듯 고칠 병이었지만 그땐 세상이 그러지 못했으니.
jeshim@seoul.co.kr
2013-06-0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