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책, 미묘한 함수관계


국회의사당
돈을 아무 때나 찍어 냈다가는 나라가 망하듯 국회의원의 책도 그렇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시기’와 ’위치’가 맞아떨어지면 ‘십수억원’이 만들어진다. 선거가 없는 해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액이 1억 5000만원이니 10년짜리 행사를 한몫에 하는 셈이다. 게다가 모두 현찰이고 선관위의 감시도 받지 않는다. 프로스포츠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뒤 7~10년의 장기계약을 맺어 ‘대박’을 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사 개최 여부와 시기를 정하는 의원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가을 이후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40여 차례. 19대 국회 개원 이후 80차례 정도다.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은 계절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다. 초청장이 돌면 선거철이나 국정감사가 임박했다는 얘기다. 책의 실질 수요자인 피감기관, 즉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기업들에는 번거롭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모두들 알고 찾아와 최소한의 흥행을 보장해 준다.
출판기념회장은 ‘세’(勢)가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하다. ‘저자’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밀려드는 검은색 대형 세단과 늘어선 화환, 놀이공원을 연상시키는 겹줄을 보고 나면 ‘실세’(實勢)라는 말의 의미가 피부로 느껴진다. 국회의원이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님을 절감하게 되는 장소이다. 그래서 출판기념회는 정치 이벤트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차지하려고 예약 사이트가 열리는 이른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서 예약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올 한 해 출판기념회는 주로 현직 의원들의 판이었지만 해가 바뀌면 3월까지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선거 출정식’이다. 예비후보들은 출판기념회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후원회로 조직할 수도 있고 이들이 낸 책값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치인들의 책이 쏟아지는데도 출판계는 대체로 시큰둥하다. 아이러니다. 책은 정가도 없고, 서점 서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 거래도 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인 데다 결정적으로 독자가 없는 유령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다. 진짜 저자가 누군지도 불확실하다. 여의도에 책이 넘쳐나면 이름도, 얼굴도 없는 ‘대필작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1000만~2000만원에 한 권의 책이 태어나고, 초판만 있을 뿐 재판 인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구조다. 그래서 출판계는 정치인들의 책을 대리모(대필작가)가 생산한 ‘씨받이 책’이라고 부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21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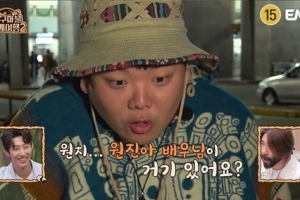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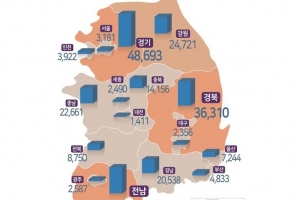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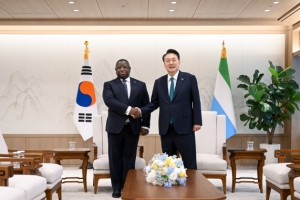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