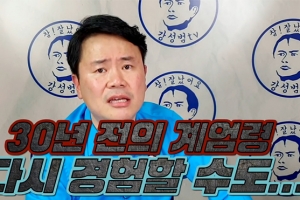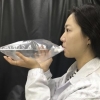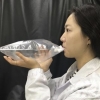“뒤집히는 것은 사랑의 환상만이
아니다. 진실을 진실로 말해도
믿지 않는 혼돈 속에서 거짓과
어깃장이 더 크게 울린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일식을 보고 있었다
깨진 병 조각을 통해.
그녀가 선원과 함께 눕던 날
숲속에서 그는 파란 연을
찾았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녀는 누더기로 만든 이불에
구름을 꿰매었다. 그들은 만나지
않았기에, 헤어질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기도를 마쳤고,
그는 바다의 지도를 접었다.
―스리칸스 레디, ‘모든 것’
2025년 겨울 뉴욕, 한밤의 급행 지하철은 가끔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속도를 늦췄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던 나는 주위를 면밀히 살폈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 내 시선을 빼앗은 것은 시가 아니라 어떤 남자였다. 그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열심히 손뜨개질을 하는 그는 키가 아주 컸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거의 몸을 구겨서 접은 듯 앉아 기계적으로 손을 놀리고 있었다. 주황과 파랑이 절묘하게 섞여 곧 예쁜 비니가 될 것이다. 귀퉁이가 터져 잠글 수도 없는 가방에는 그가 만든 것들이 알록달록 수북하다. 아마 어느 지하철역 귀퉁이에서 하나에 몇 달러씩 팔리겠지. 일부러 시선을 위로 두다가 이 시를 만난 나는 내리기 직전에 가까스로 시를 사진에 담았다.
첫 연이 단박에 눈에 들어왔다. 그와 그녀. 두 사람. 그는 집을 떠났고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고 그저 일식을 보고 있었다. 그것도 깨진 병 조각을 통해. 깨진 병 조각과 떠남. 사랑이 깨진 것이다. 그녀는 곧 다시 헤어질 짧은 만남을 이어 가고 그는 숲에서 파란 연을 찾고 이름을 바꾼다. 자기 정체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나 보다. 그녀는 이불을 꿰매며 구름을 만든다. 이 사랑이 좀 가엾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시인은 말한다. 그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서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처음에 가엾은 연인의 별리를 상상하던 내 시 읽기는 다시 시작한다. 이 시는 아무 관계 없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다. 시인은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달달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는 실제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결혼해도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만나지 않는 사람·사랑 이야기를 써 보고 싶었다고 한다.
시 읽기 행사에서 이 얘기를 하자 청중들이 낮게 웃었다. 사랑은 무얼까. 사랑은 만남이다. 만남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시는 사랑의 불능을 말하는 시절의 슬픈 초상인가.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면서 무언가를 만난다. 여자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라도 일식을 본다.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다. 남자는 숲속에서 연을 발견한다. 발견 또한 만남이다. 새로 시작하는 희망이 그 안에 있다.
남루한 일상을 어떻게든 이어 가며 자기 삶을 사는 이의 모든 것. 처음에 예상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시를 다 읽고 나는 내심 안도한다. 여자는 기도를 마치며 하루를 닫고 남자에겐 여전히 바다의 지도가 있다. 둘이 만나 결혼을 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알콩달콩 사는 꿈은 동화처럼 멀다. 뒤집히는 것은 사랑의 환상만이 아니다. 수십년 올곧게 지켜 온 직업윤리, 믿고 따르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배반당한다. 진실을 진실로 말해도 믿지 않는 혼돈 속에서 거짓과 어깃장이 더 크게 울린다.
그에 비하면 이 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전한다.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어떻게든 우리는 만난다고. 우리가 함께 놓인 이 세계에서 충실히 이어 가는 하루의 시간이면 된다고.
낯선 도시의 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풍경. 나는 미약한 희망을 길어 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하루하루를 잘 보내며 봄을 준비하자고. 뜨개질 노인은 나와 같은 정류장에 내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굽은 등을 오래 바라봤다. 정직한 노동, 그 끝에 곤한 잠이 있기를 빌며.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2025-02-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